여름의 풍경은 싱그럽기도 하고 으리으리하기도 하다. 자연의 지배를 받기에 이런 햇살과 이런 온도라면 사람은 그저 유유자적하고 넉넉할 것 같은데 올해 여름은 특별할 정도로 감각이 예민하게 느껴진다.
오랜만에 뮤지엄 산에 다녀왔다. 명상관을 처음 들어갔는데 소리 파형을 온몸으로 느끼는 기분은 공간이 주는 감흥에 비할바가 아니었다. 여름의 뙤약볕이 묘하게 느껴지는 공기도 좋았다. 기획전시 곰리전은 특별했다. 전세계에서 최초로 안도타다오와 협업으로 작품을 공개한 곳이 하필 원주라는 것도 신기했고 GROUND라는 제목으로 땅속을 파서는 트인 곡률로 익숙한 강원도 산자락을 바라보는 느낌은 단순히 지역민으로서의 기쁨만은 아니었다.
내 몸에서 시작했지만 공간에 놓아두는 순간 타인 혹은 물성이 되는 것은 사실. 그러나 사실 너머에 그 물성과 상호작용하는 사람이 있고 한편으로는 그 사람을 거기까지 오게 한 공간의 이야기도 있다. 아쉬운 점은 그 공간을 동시간에 공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느껴지지 않고 각자의 인증샷들에 덮여서 이야기가 들리기 보다 존재가 거슬렸다는 것인데, 나는 뮤지엄산 연회원이니 다른 시간에 다른 사람과 작품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전 내릴때가지 몇번 더 가볼 계획이다.
퍼블릭아트 구독해서 전시 관련한 글들도 다시 읽고 있고 인스타그램 팔로우 리스트를 갤러리 위주로 정리해서 가보고 싶은 전시를 집중력있게 리스트업 해보고 있다. SNS 덕에 가지 않고 전시를 쉽게 간접 체험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좋은데, 예전에 비해 확실히 내가 실재로는 덜 다니는 느낌이 있다. 요즘 미술업계도 찬바람이 쌩쌩 분다는데, 이럴 때가 구경다닐 때다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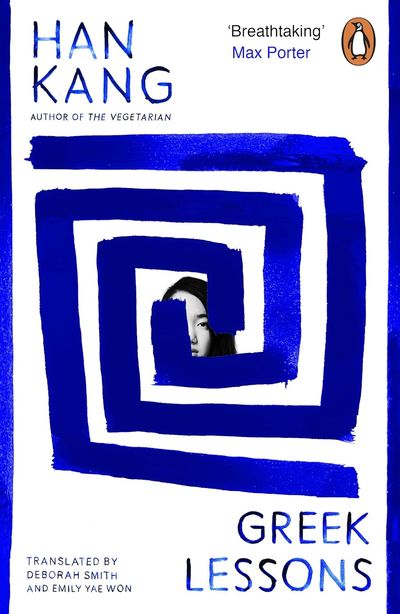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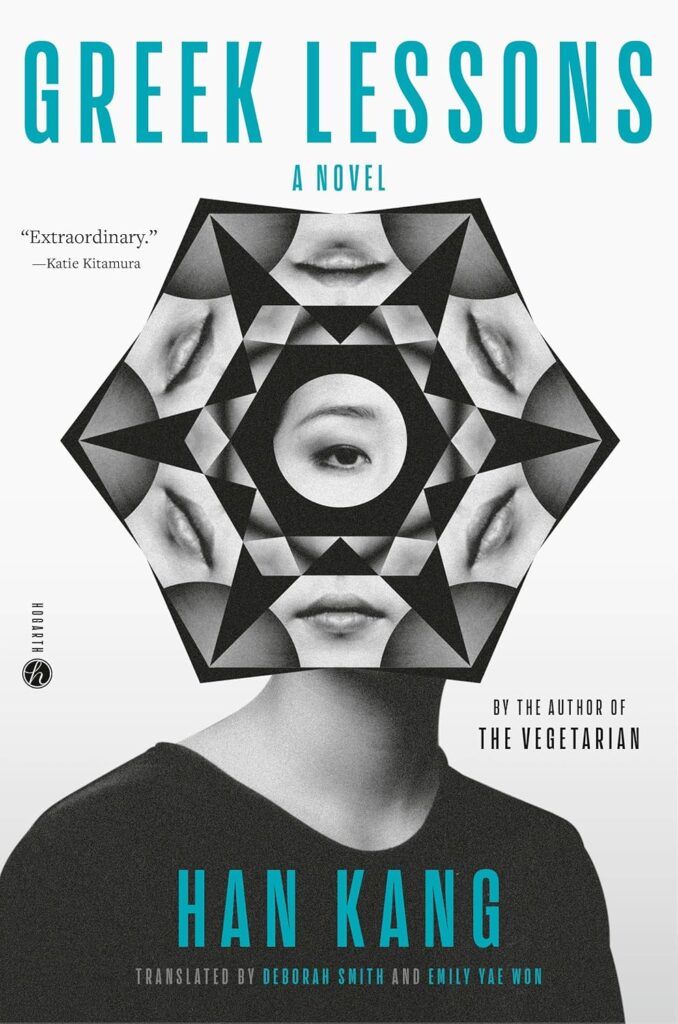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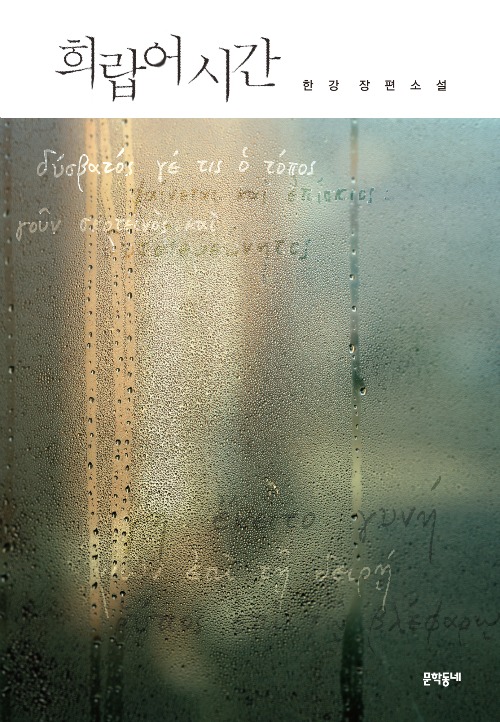
감정이 예민하면 나를 돌아세우기 위해 실용서나 읽을 일이지 싶은데 실용서는 좀체 안 읽힌다. 한번은 할일을 다 젖혀두고 소설을 찾아 새벽에 읽는 내가 무력하게 느껴져 야심한 밤에 chatGPT와 심리 상담을 했다. 나같은 사람은 소설을 읽음으로서 치유받는 부분이 있으니 죄책감 갖지 말라고 했다. 진실 여부를 떠나 내 행동의 합리화를 이끌어 낸 AI에 힘입어 읽는 내내 어수선할 정도로 복잡한 현실과 대척점에 있는 것만 같았던 죽은 듯 살아 있는 자들의 이야기, 희랍어 시간을 끝냈다. 무더운 여름에 한강 소설은 질펀하다. 생명의 연약함에 대한 한강 작가의 시선은 자주 불편할 정도로 진실되고 생명의 지리멸렬한 힘에 대한 시선은 종종 고마울 정도로 위로가 된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희랍어 선생님의(다 읽고 나도 주인공에 관련된, 이름. 나이. 관계 이런 건 기억날만한게 없다) 고백이 담긴 편지였다. 겉보기에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지만 내 희망이라고는 없는 상황에 놓인, 죽은 체 하지만 죽지 않는 생명의 순간들을 색과 언어마저 제약해놓고 긴장감있게 묘사했다. 그 묘사 어디에도 현학적인 단어도 없고 과장된 감정적 단어도 없기에, 읽어본 소설 중 가장 특이하고 가장 비릿했다고나 할까. 기분이 나쁜 건 아닌데 뭔가 내 어딘가 끝이나 썩기 시작하는 비릿함을 느끼는 기분이 들었다. 이런 경험은 이 작품 외에는 못할 것 같다.
어느 날 퇴근 길에 들린 윤종신의 ‘좋니’가 왜 좋지. 요즘 내 플레이리스트에는 종종 김건모도 올라온다. 잡다한 주변 이슈로 묻혀서 가수를 보지 못하고 신곡이 멈춘 건 참 아쉬운 일이다. 노래와 책과 그림을 즐기고 보는 시선이 모두 예민해진 요즘. 봄, 가을과 다른, 기분 좋은 여름의 센티멘탈함 한가운데에 있는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