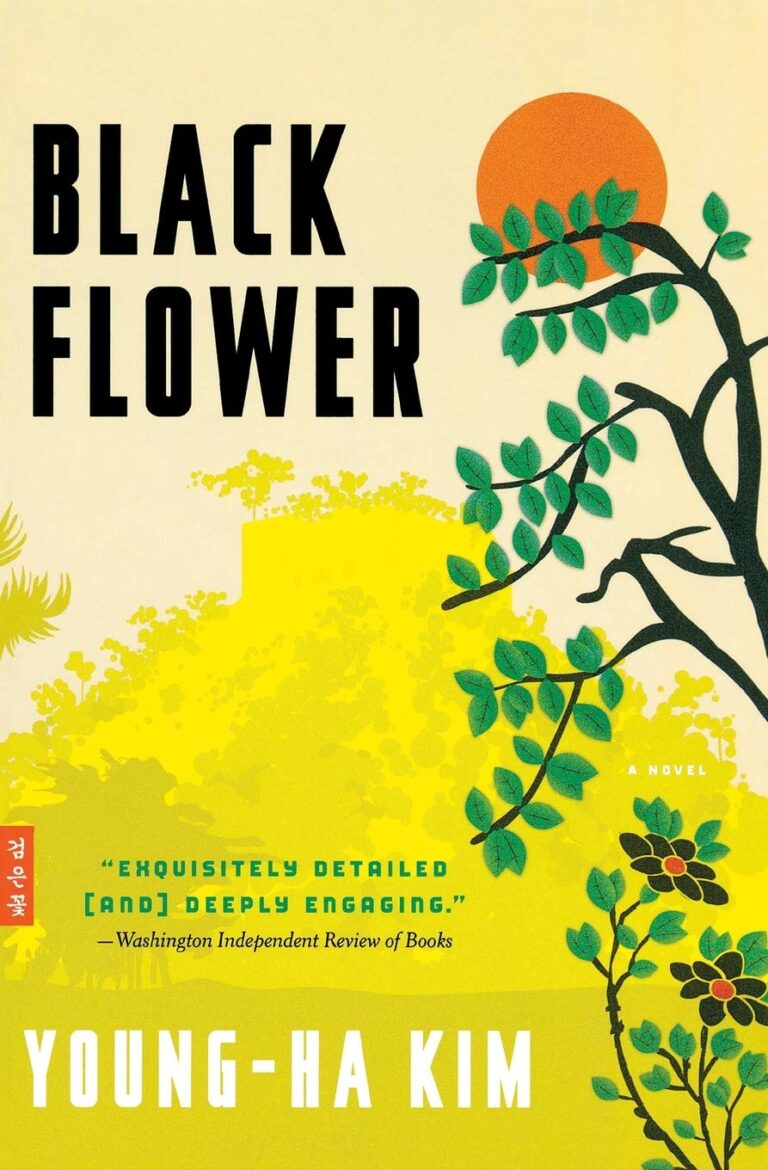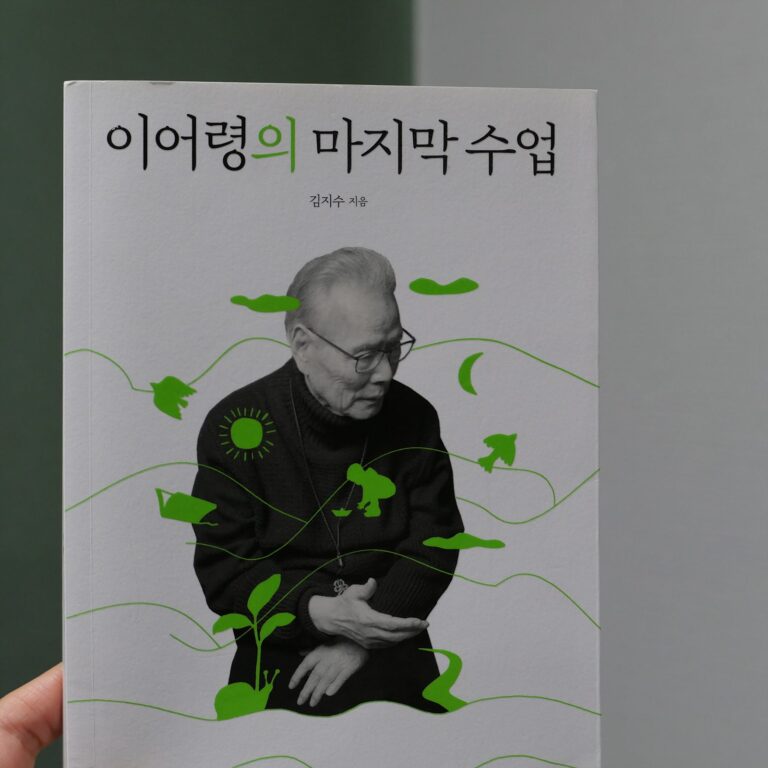나의 빈티지 이야기
딱 일년전 일본 여행에서 빈티지 꼼데 가르송 웨어를 두벌 샀다. 그 이후로 빈티지와 연결(?) 되었는지 빈티지 인형, 그릇, 옷, 책. 빈티지 사물들를 좋아하게 되었다. 집에는 내 나름 골라 모은 이런저런 빈티지들이 쌓여가는 중이다. 매스 생산에 젖어 비싼 명품들도 SNS를 도배하는 시대가 되자 단종된 물건, 더는 살 수 없는 물건에 더 마음이 가기 때문인 걸까. 혹은 공장에서 생산하기 어려웠던 시절의 만듬새와 그 물건을 거쳤을 이야기들에 친근한 매력을 느껴서일까. 나는 이것을 향수라고 말하기엔 차마 자존심 상하는 40대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며느리인 엄마에게 전달된 물건 중 하나인 밍크 코트다. 할머니의 형제가 일본에 계셔서 간혹 그런 물건들이 할머니댁에 있었는데 귀해질 줄 몰랐으니 구닥다리라며 거의 다 버려졌다. 밍크 코트는 값이 나가니 버려지지 않고 엄마에게 전달되었다. 그런데 긴 풀코트가 너무 올드해서 싫었던 엄마는 하프코트로, 칠부로 재단을 했다. 내겐 못내 아쉬운 점이 리폼을 거쳤다는 거다. 예전의 그 부담스러운 길이가 그대로 보존되었다면 더 좋았을텐데.. 어쨌든 할머니가 이 밍크 코트를 입고 진짜 큰 루비 반지를 끼고 안경 끼고 아빠 차 뒷자리에 앉으셔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시던 모습을 기억하는 나로서는 입을 때 마다 따뜻하다. 물건 중에는 할머니의 것이 내 것이 된 유일한 것이다.

LA에서 2010년에 구입한 영수증이 그대로 담긴 M56382 루이비통 가방은 어머니 옷장 안에서 12년 넘게 보관만 되어 있다가 내게 전달되었다. 어느덧 세월이 빈티지 끄트머리 반열에 올려놓은 이 호보 가방이 요즘 내 최애 루이비통 가방 중 하나이다. 어릴때는 모노그램이 촌스럽다 생각되었는데 취향이 참 희안하게 변한다. 요즘 20대들이 과거 내가 그랬듯 심플한 걸 좋아하는 걸 보면 분명 시선이 나이를 타고 변하는 면이 있다. 걔네들 눈엔 내가 촌스럽겠지. 하지만 셀린느고 버버리고 다 나눠주고 팔고 펜트리에 남은 가방들을 보고 있노라니 모노그램이면서 가볍고 수납하기 좋은 가방만큼 룩을 가리지 않는 장르도 없다. 명품 가방이라지만 너무 우아하지 않은 이 브랜드의 느낌도 나는 좋다. 사이즈가 넉넉한 아름다운 모노그램 신상이 출시된다면 앞으로도 몇개는 더 갖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