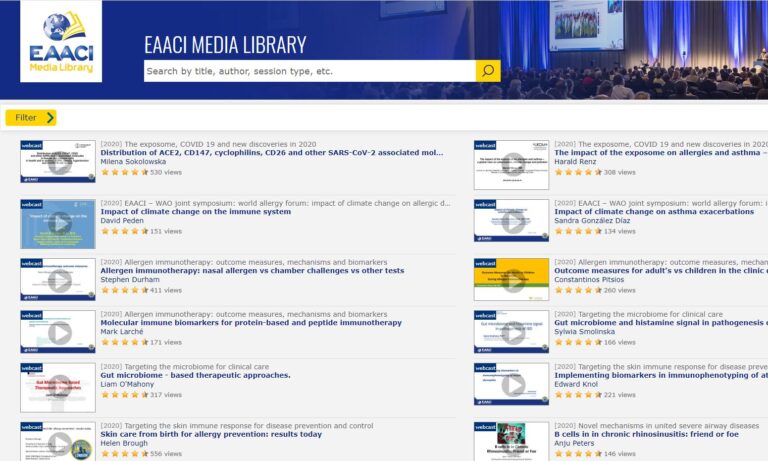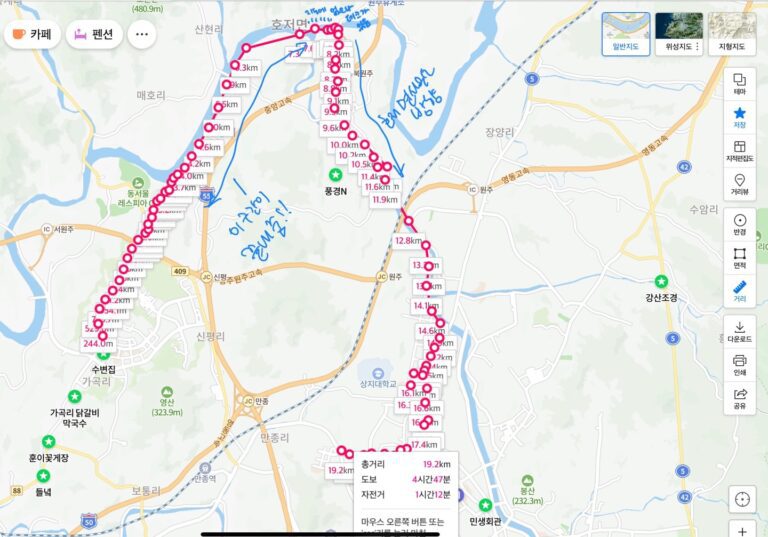스승이라…
의대에는 담임반 제도가 있다. 진로의 방향이 다양하고 다른 전공에 비해 많은 시험과 암기를 소화해야 하다 보니 평생 인정받던 학생이 절망에 놓이기도 하는 터에 마련한 제도가 아닐까 싶다. 작년에 담임반 학생을 맡아달라는 전화를 받고 내가 무슨 담임반 교수가 되나 싶었는데 올해 두명이 더 추가되어 네명의 담임반 학생을 꾸리는 스승?이 되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의대 교수가 된 것도 쑥스러운데 학교 다닐 때 후회없이 놀고 사고도 쳤으며 인턴 때도 자유롭게 하고 싶은대로 하고 살았던 거 생각하면 내가 담임반 교수까지 하는 건 좀 안어울린다 싶다. 나름의 장점도 있으리라 생각해 본다.

다행인지 내 담임반 학생들은 모두 내 과거보다는 성실하고 소심한 듯 보였다. 하지만 먼저 의사 생활을 하고 있는 자로서 너무나 어려워지고 있는 의료 현실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걱정되는 부분도 큰건 사실이다. 그들이 꿈꾸던 의사가 되기에는 척박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되는 직업을 가진 기쁨 안에서 행복하게 성장하길 바라고 그럴려면 나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지고 행복해보이는 스승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스스로 합리화하는 힘이 워낙에 강력하여 대체로 그렇게 살긴한데 안그럴때도 있는 게 사실. 요몇달 이래저래 더 힘들던 와중에 만났던 순수하고 빛나고 착한 의대생들. 어떤 의미로는 학생들이 나를 격려하고 일으켜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랜만에 본 졸국한 전공의들도 반가웠다. 바쁜 가운데 찾아와서 함께 나눈 시간들을 추억하며 감사를 전하는 마음이 고마웠다. 돌이켜보면 나는 힘들기만 했던 수련의 세월이었던 것 같은데 그들도 그랬을텐데 그 어려웠던 시간을 고맙다 표현해주는 따뜻한 의리가 고마웠다고나 할까.

여러 구설에 휘말려 힘든 시간을 보냈던 전공의도 편지를 들고 찾아왔다. 누군가를 찍어내버리고 싶은 게 다소 발생하는 게 조직이긴 하지만 나를 돌아보면 완벽한 인격이라 말할 수 없기에 어떤 위치에서 벌어지는 다툼에 한편을 영원히 들고 싶은 마음은 없다. 내 태도가 누군가에겐 박쥐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나는 정의는 분명해도 선악은 분명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편이며 질투하고 화내는 사람의 미천한 본성을 사랑한다.
얼마전 선택실습을 마치고 떠난 학생도 편지를 들고 찾아왔다. 나처럼 멋진 소아과의사가 되고 싶단다. 하핫.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새삼스러운 책임감이 들던 하루였다. 많이 양보하고 헌신하고 살아야겠다 싶었다. 무엇이 내 본캐이고 부캐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내 직업과 내 위치가 인상주의자에 가까웠던 나를 여러모로 다른 방향으로 인도(?)중이긴 하다.